디지털 강국을 자처하는 한국 사회가 이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과 SNS를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절제할 힘을 가르칠 것인가’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는 학교 내 휴대폰 사용 금지와 청소년 SNS 연령 제한 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브레멘주는 초등학교부터 10학년까지 휴대폰을 가방 속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했고, EU 집행위원장은 “흡연이나 음주처럼 SNS에도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12월부터 시행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금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독일의 심리학자 카타리나 샤이터 교수는 “스마트폰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일 수 있다”며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지 않으면 규제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경고했다. 아이들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 조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정부와 기업이 앞다퉈 AI·코딩 교육을 강조하지만, 정작 아이들에게 필요한 ‘선택의 힘’을 키워주는 교육은 부족하다. 스마트기기가 아이들을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오히려 집중력과 공감 능력을 약화시키는지에 대한 성찰이 빠져 있다.
청소년 우울증, 사이버 괴롭힘, 혐오 콘텐츠 노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기업의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다. 아이들의 시간을 ‘상품화’하는 플랫폼 환경 속에서, 학교와 사회가 가르쳐야 할 것은 ‘어떻게 더 많이 생산할까’가 아니라 ‘언제 기기를 내려놓을까’이다.
단순한 사용 금지와 무조건적 활용 장려 사이에서 한국 사회는 여전히 후자에 치우쳐 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기술과 인간의 균형이다. 아이들이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앱이 아니라 절제와 관계를 지켜주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SNS 연령 제한 논의는 결국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근본적 질문 — ‘기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에 대한 성찰의 출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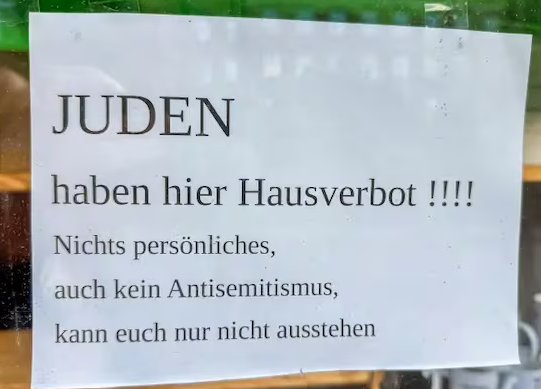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