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과 2025년(추정치)을 나란히 놓은 유럽 GDP 순위표는 경제력 재편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극명하게 드러낸다. 1960년 1위는 자원과 동원경제에 기댄 소련이었고, 독일은 분단된 채 중위권에 머물렀다. 동유럽은 계획경제권으로 하위권에 속했다. 그러나 2025년으로 오면 독일이 유럽 최대 경제국으로 올라서고, 영국·프랑스·이탈리아가 뒤를 이으며 러시아는 5위로 내려앉는다.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가 약진했고, 튀르키예는 체급을 불렸으며 아일랜드는 다국적 본사 회계 효과로 급부상했다.
이 흐름을 만든 핵심은 제도다. 유럽 단일시장(1993년), 유로 도입, 동·남부 확장(2004년 이후)이 규범·시장 접근성·자본 이동을 열어 경제력 수렴(convergence)을 촉발했다. 반대로 러시아는 자원 의존, 제재, 전쟁 리스크로 탈수렴(divergence)의 전형을 보여줬다.
다만 이 표는 명목 달러 기준이어서 환율·물가에 민감하다. 생활수준을 제대로 보려면 1인당 GDP나 구매력 기준(PPP)을 봐야 한다.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가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도 이 지표다.
정책적 함의는 단순하다. 체제가 서열을 갈랐던 냉전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제도·통합·인적자본이 국가의 체급을 결정한다.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분모는 세 가지다. 첫째, 법치·규제 예측 가능성·일관된 거버넌스 같은 제도 품질. 둘째, 에너지·데이터·자본의 완전한 단일시장과의 깊은 통합. 셋째, 고급기술·서비스로의 업그레이드를 뒷받침하는 인적자본과 이민이다.
향후 10년 유럽이 주도권을 쥐려면 에너지유니온, 자본시장유니온, 디지털 단일시장을 완결하고 동부 제조벨트를 녹색·디지털 전환, 공동 방위산업 체인으로 엮어야 한다. 국가별 교훈도 분명하다. 자원과 환율은 일시적이지만 제도는 복리다. 유럽 규범에 더 깊이 연결될수록 올라가고(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규범에서 이탈할수록 내려앉는다(러시아, 부분적으로 튀르키예). 이 순위표의 가치는 단순한 숫자에 있지 않다. 그것은 제도 선택의 장기 성적표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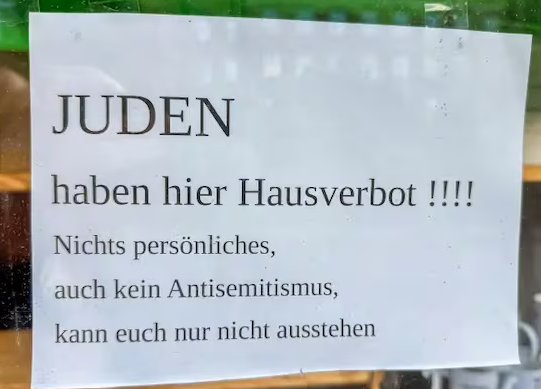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