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익환과 김장환, 두 인물은 모두 평생을 종교인으로 살아온 인물이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서 신앙의 공통된 울림은 찾기 어렵다. 문익환은 고난의 시대에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예수의 길을 실천한 인물이었다. 장준하, 전태일, 이한열의 이름을 부르며 투쟁의 현장을 지켰고, 윤동주의 벗으로서 그가 못다한 삶에 대한 책임감을 안고 살았다.
이에 비해 김장환은 시대의 어둠 속에서 늘 권력에 기대 서 있던 모습으로 회자된다. 뚜렷한 진보적 발언이나 고난받는 이들과의 연대보다는, 기득권과의 유착, 정치권과의 교류가 더 익숙한 이름이다. 최근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이용훈 등 보수 기독교계 주요 인사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목하자, 일부에서는 “성역을 건드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독교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기독교가 그 이름으로 군림하고 권력과 결탁하며 자신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할 때, 그에 대한 비판과 조사는 결코 ‘종교 탄압’이 아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든 법의 잣대를 적용받아야 하며, 종교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이는 헌법과 상식,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정신에 부합하는 길이다.
한편, 성남 주민교회는 또 다른 신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하다 수배 중 피신한 곳이 바로 이 교회였다. 그 지하에서 그는 인권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의 삶을 결심했다. 이는 교회가 권력의 방패막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오늘의 한국사회는 분단과 내란, 사회적 분열이라는 고개마루를 넘고 있다. 이재명과 시민들이 함께 외친 개혁의 함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정치권 일부는 벌써 전선을 이탈해 축배를 들고 있는 듯한 모습도 포착된다. 현실에 안주하고 샴페인을 준비할 시점이 아니다.
문익환이 꿈꾼 ‘늦봄’처럼, 비록 봄이 늦게 찾아오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가 기득권 종교의 그늘을 벗고, 진정한 신앙과 정의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그 갈림길 위에 서 있다. 그리고 지금, 껍데기를 벗겨낸 맨몸의 정의가 다시 한 번 봄을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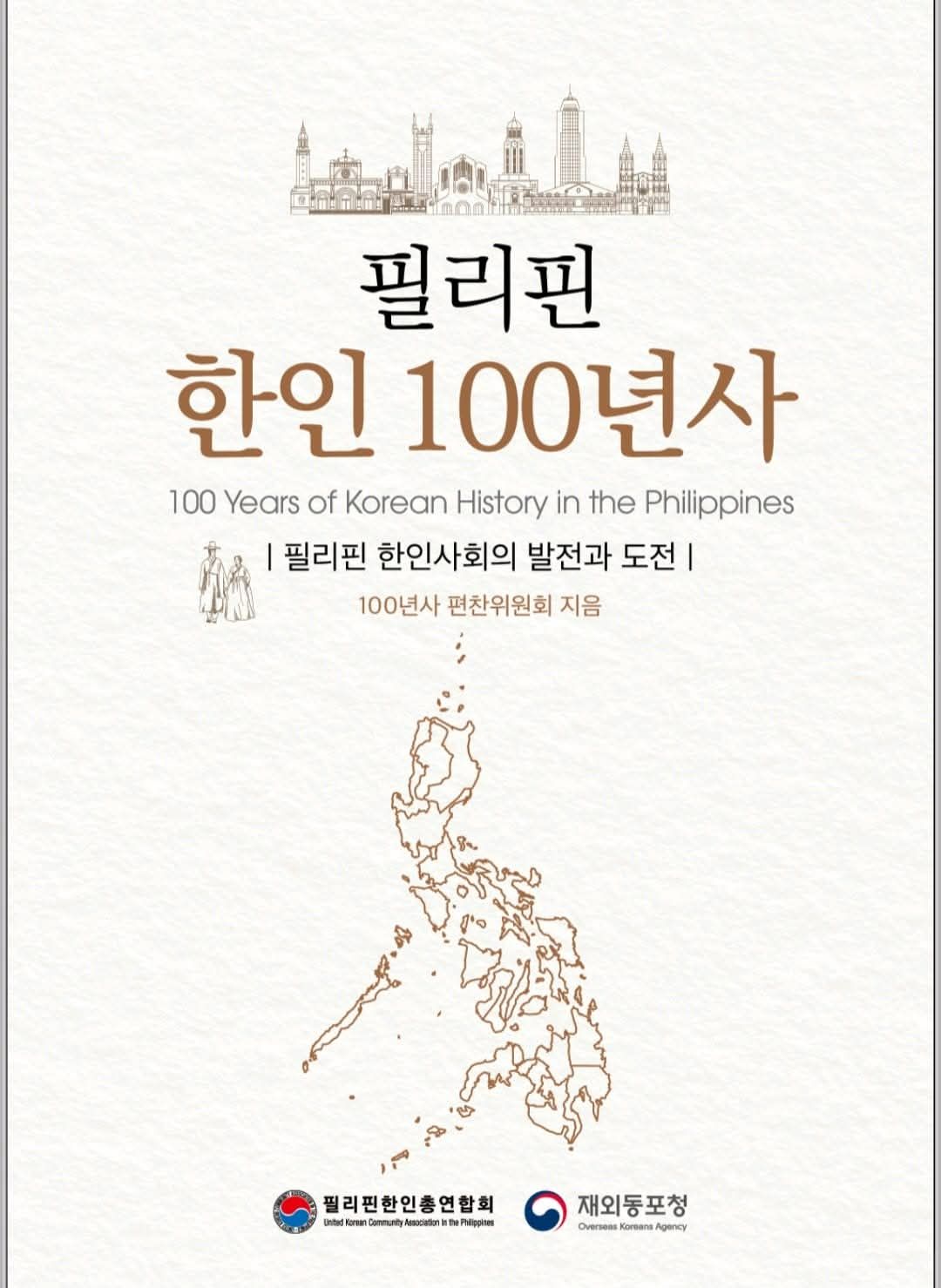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