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가 개봉한 뒤 평단과 관객 사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심지어 오랜 팬을 자처하는 이들 가운데도 별점 1점을 매기며 ‘최악’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이 영화를 단순히 실패작으로 단정 짓기는 이르다.
낮은 평점을 준 관객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묘한 공통점이 보인다. 직업적 좌절이나 중장년기의 부당해고를 직접 겪어보지 않았거나, 경제적 곤궁 속에서 존엄을 위협받는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에게 영화 속 만수의 고통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설정에 불과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만수의 치통 장면에 공감한 관객도 적지 않다. 치통은 단순한 통증을 넘어 빈곤이 초래하는 인간 존엄의 상처를 드러낸다. 치료비가 없어 이를 뽑은 채 수년을 버텨야 했던 경험을 가진 이들에게 스크린 속 고통은 과장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현실이다.
결국 영화는 각자의 삶과 기억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누군가는 무심히 지나치는 장면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상처를 일깨운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과 시선의 차이다. 〈어쩔 수가 없다〉라는 제목처럼, 작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영화와 예술은 시험지가 아니다. 정답이나 오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의 삶이 빚어낸 고유한 답안이 있을 뿐이다. 누군가는 깊이 몰입했고, 누군가는 끝내 공감하지 못했다. 그 간극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영화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가장 성숙한 응답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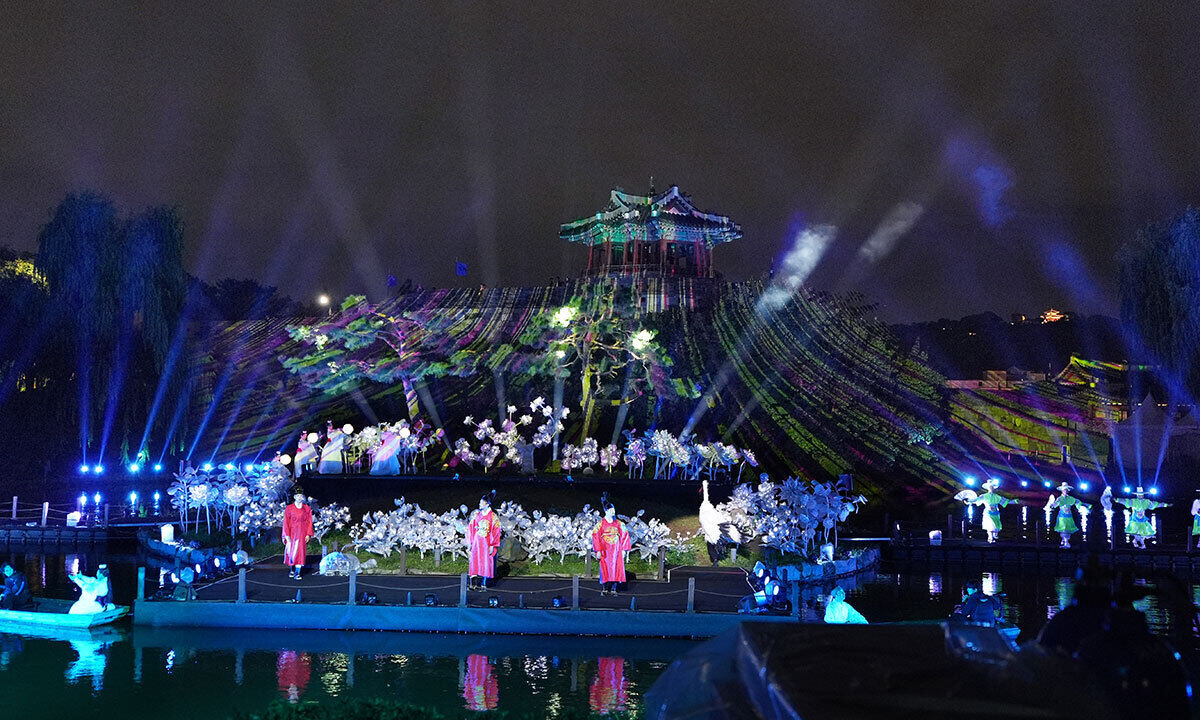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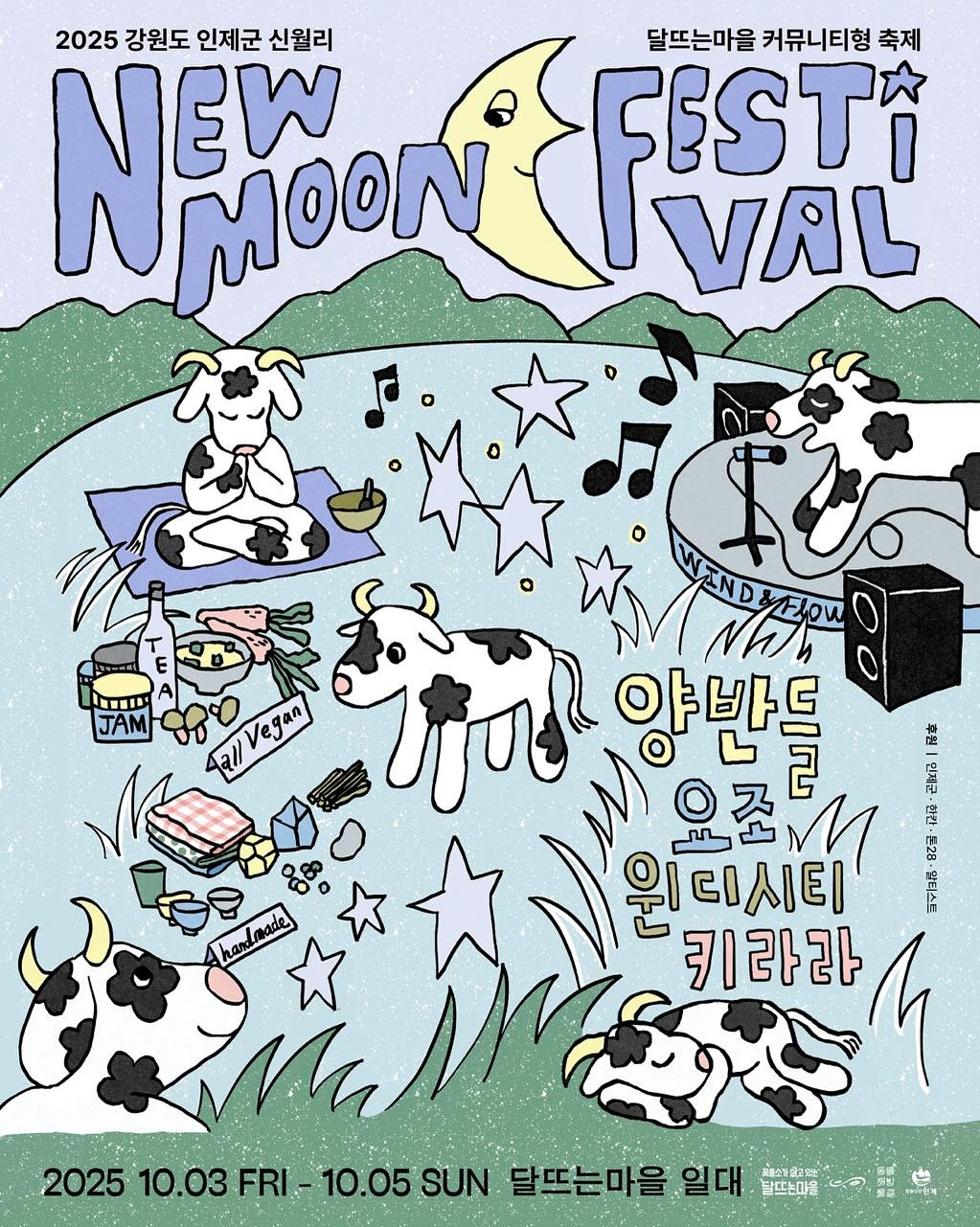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