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 이황이 젊은 며느리를 개가시켰다는 일화는 오랫동안 유가 윤리의 시험대에 올라 있었다.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은 며느리를 수절의 틀에 묶지 않고, 인간의 삶과 고통을 먼저 보았다는 점에서 그는 윤리를 어겼다는 비판과 윤리를 지켰다는 찬사를 동시에 받아왔다.
조선 시대의 기준에서 며느리는 가문과 제사의 일부였고, 수절은 미덕이자 의무로 여겨졌다. 이런 사회에서 퇴계의 선택은 파격이었다. 그는 며느리의 방에서 들려온 혼잣말과 흐느낌을 보고, 윤리라는 이름으로 한 인간의 삶을 가두는 것이 과연 옳은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제도보다 사람을 택했다.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평가는 달라진다. 현대 사회는 개인의 삶과 선택을 존중한다. 배우자를 잃은 젊은 여성이 다시 삶을 꾸리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기준에서 퇴계의 결정은 시대를 앞선 판단으로 읽힌다. 혈통과 가문보다 개인의 행복을 중시한 선택, 형식보다 실질을 본 결정이라는 평가가 많다.
물론 당시의 질서를 흔들었다는 점에서 비판도 남아 있다. 공동체의 규범을 개인의 판단으로 넘어섰다는 점, 가문의 체면과 관계를 스스로 끊었다는 점은 유가 질서 안에서는 문제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규범이 인간을 억누를 때 그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규범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지, 사람이 규범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보편화됐다.
그래서 오늘의 퇴계는 ‘윤리를 어긴 사람’보다는 ‘윤리의 본뜻을 다시 묻는 사람’으로 읽힌다. 그는 규칙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규칙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그 목적이 인간의 삶을 해칠 때 과감히 다른 길을 택했다. 윤리를 지키기 위해 윤리의 껍데기를 깬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다.
이 일화가 오늘에도 의미를 갖는 이유는 분명하다. 사회는 여전히 관습과 규범으로 개인을 재단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퇴계의 선택은 묻는다. 지금 지키려는 규범은 사람을 살리는가, 아니면 사람을 묶는가. 윤리는 규칙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질문을, 수백 년 전 한 선비의 선택이 지금도 던지고 있다.
퇴계의 선택, 오늘의 기준으로 다시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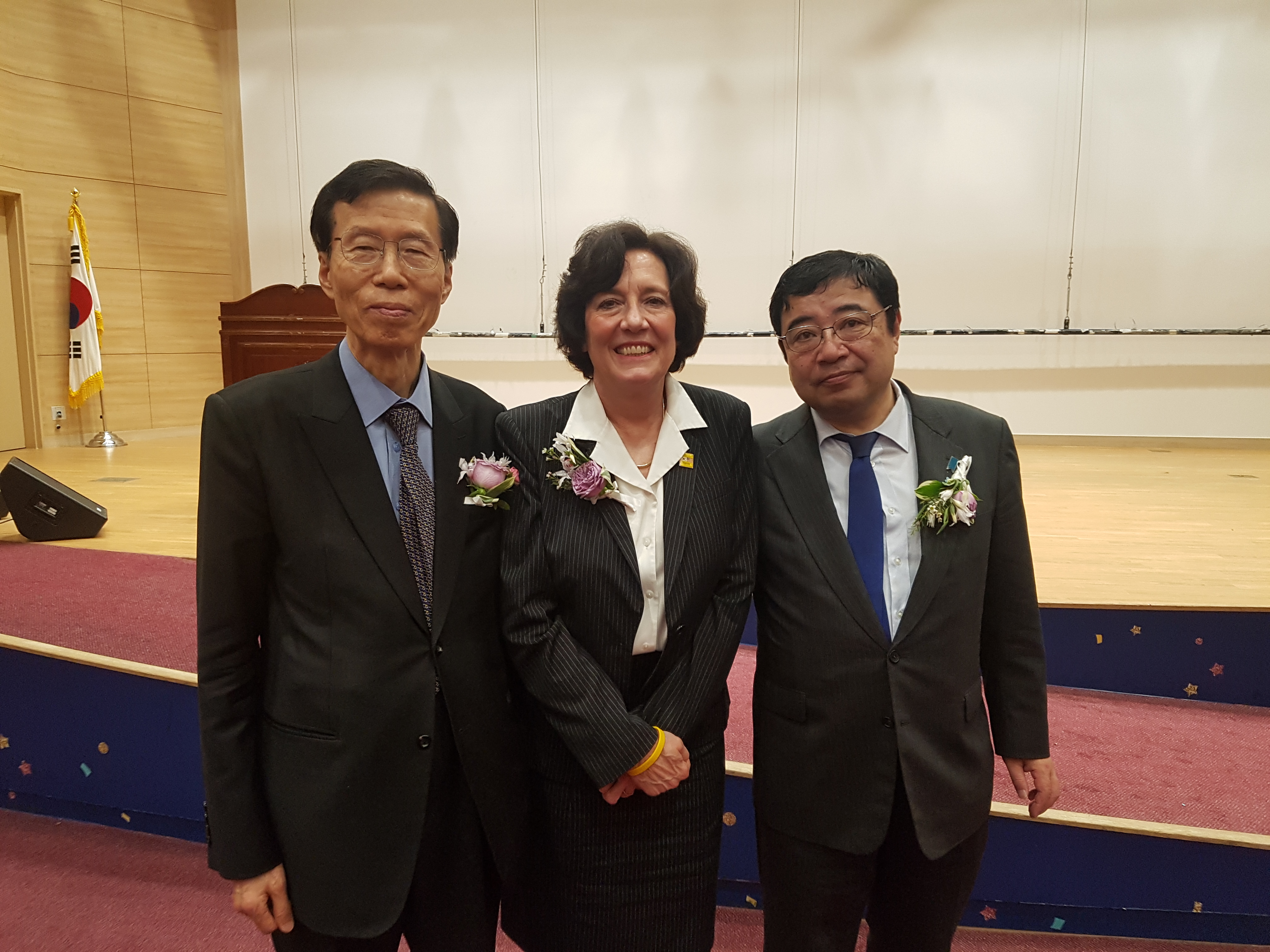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