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의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세종대로를 걷다 보면, 600년의 시간이 한길로 이어져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조선이 한양으로 천도한 1394년, 새 도성의 중심에는 경복궁과 함께 정치의 심장이었던 ‘육조거리’가 놓였다. 경복궁 앞에서부터 이·호·예·병·형·공의 여섯 관청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길은 나라의 숨결이 오가는 상징이었다.
지금의 세종대로는 바로 그 옛 육조거리의 연장선이다. 2010년, 서울시는 종로구 세종로와 중구 태평로를 하나로 묶어 ‘세종대로’로 통합했다. 경복궁 입구에서 숭례문 앞까지 2.1km 남짓한 이 길은 과거의 행정축이자 오늘의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와 시민의 거리다.
광화문, ‘교화의 빛’이 된 이름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으로, ‘군주의 교화가 빛처럼 온 나라를 비춘다’는 뜻을 지닌다. 2006년 해체·복원을 거쳐 2010년 8월 15일 광복절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일제강점기에는 이 일대를 ‘광화문통’이라 불렀으며, 이후 ‘세종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시민들에겐 여전히 ‘광화문’이 가장 익숙한 이름이다.
광화문광장의 상징물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은 1968년 세워졌다. 임진왜란의 승리를 기리는 133개의 분수는 명량해전과 한산대첩의 상징이다. 2009년 한글날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더해져, 두 영웅이 나란히 도심의 역사를 지키고 있다. 세종대왕의 왼손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들려 있다.
세종문화회관과 정부서울청사, ‘현대판 육조거리’
세종문화회관은 1972년 서울시민회관 화재로 사망자 50여 명을 낸 비극의 자리에 재건됐다. 화강암 기둥과 비천상을 형상화한 외벽이 인상적인 이곳은 1988년 예술의전당이 개관하기 전까지 한국 공연예술의 중심 무대였다. 바로 옆 정부서울청사는 1970년 완공 당시 국내 최대 규모 건물로, 지금도 중앙행정기관들이 자리해 조선의 육조거리 기능을 현대적으로 이어간다.
서울의 시간, 덕수궁 돌담길로 이어지다
광화문네거리를 지나 남쪽으로 걸으면 덕수궁 돌담길에 닿는다. 덕수궁은 원래 세조의 손자 월산대군의 집이었다. 임진왜란 후 선조가 임시 궁으로 사용하면서 행궁이 되었고,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서 돌아와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 정궁이 되었다. 1907년 고종의 장수를 기원하며 이름을 ‘덕수궁’으로 바꿨다.
대한문 앞을 지나면 웨스틴조선호텔 옆 팔각 전각 ‘황궁우’가 눈에 들어온다. 대한제국 시기 천신에게 제사드리던 제천단 ‘원구단’의 일부다. 일제가 1913년 철도호텔을 세우며 원구단을 헐었고, 황궁우만이 오늘 그 흔적을 전한다.
서울시청과 서울도서관, 그리고 ‘시간의 흔적’
서울시청은 1926년 일제가 세운 경성부청사 건물이다. 광복 이후 80여 년간 서울시의 중심으로 사용됐고, 2012년 신청사가 완공된 뒤 서울도서관으로 바뀌었다. 이 건물은 조선시대 병기 제작 기관이던 군기시 터 위에 세워졌다. 시청 지하에는 당시 유물이 전시된 ‘군기시 유적전시실’이 있다.
광화문 사거리 교보빌딩 앞에는 ‘고종 즉위 40년 칭경기념비전’이 서 있다. 1903년 세워진 비각 안에는 1914년 조선총독부가 설치한 ‘도로원표’가 보존돼 있다.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 간의 거리를 표시한 이 표석은 근대 도로의 출발점을 상징한다.
역사의 시간 위를 걷다
세종대로는 길이면서, 한 나라의 연대기다. 조선의 관청 거리에서 식민지 근대화의 현장으로, 다시 민주화와 시민공간으로 변모한 역사가 이 축을 따라 흐른다.
경복궁역 6번 출구에서 출발해 정부서울청사와 세종문화회관을 지나 덕수궁 대한문과 황궁우, 서울도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까지 걷는 데는 약 두 시간이 걸린다. 계절이 바뀌는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은행잎을 따라 걷다 보면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한길 위에서 맞닿아 있음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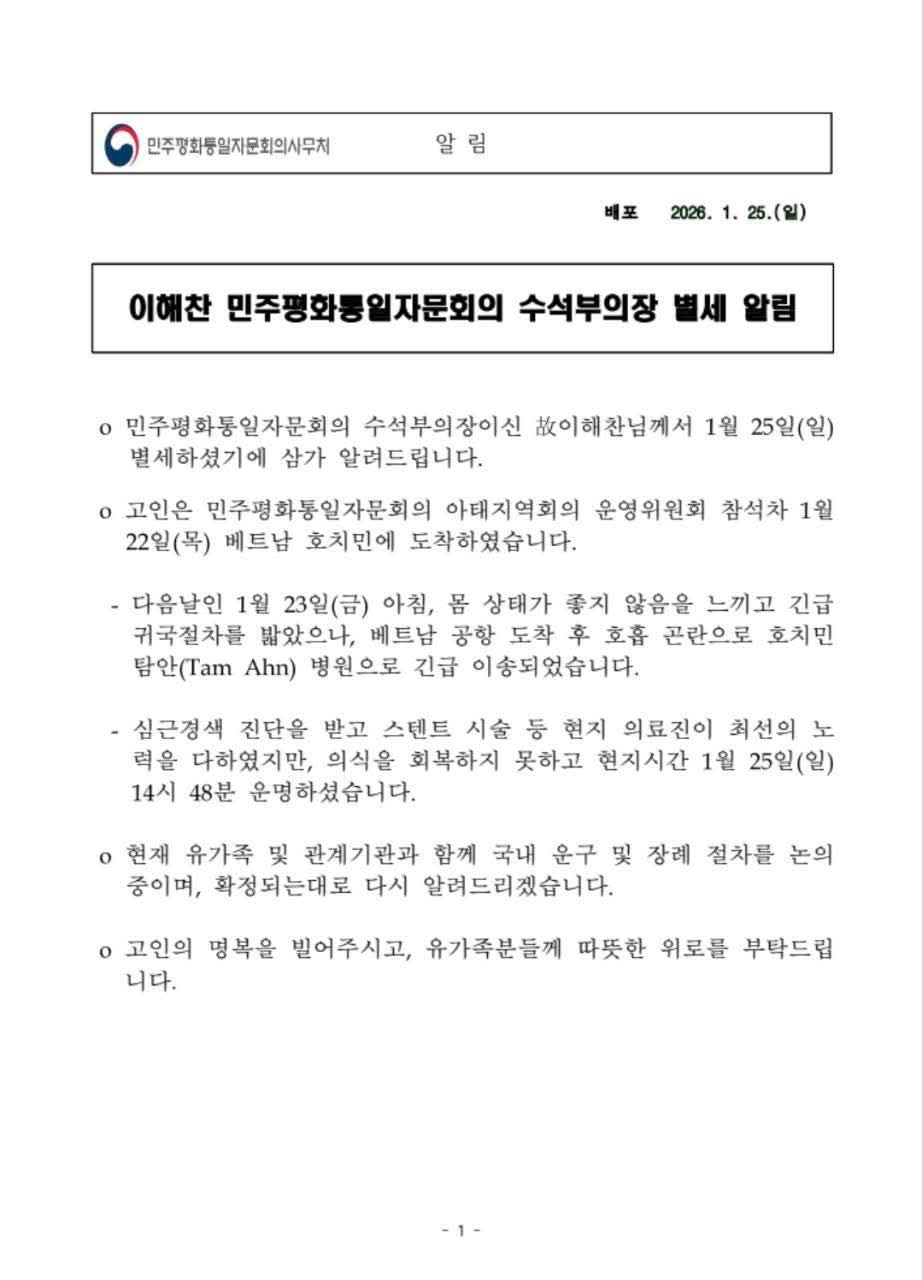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