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안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대형병원이 환자를 제때 수용하지 못해 3000명이 넘는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직후부터 약 6개월간 병원 진료 공백이 이어지며, 평년보다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7월 사이 의료기관의 초과사망자는 3136명으로 집계됐다. 초과사망은 통계적 예측치보다 실제 사망자가 얼마나 더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같은 기간 입원 환자는 467만여 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4만 명 가까이 줄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1500여 명 증가했다. 입원환자 대비 사망률도 0.81%에서 1.01%로 상승했다.
특히 초과사망이 많이 발생한 질환은 고령층에서 흔한 기질성 장애, 심부전, 쇼크, 패혈증, 무산소성 뇌손상 등이다. 이들 질환은 주로 대형병원에서 전공의가 맡아 진료하던 분야다. 김윤 의원은 “의정갈등 이후 대형병원을 찾은 중환자들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숨진 사례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요양병원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 1월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폐렴이 악화된 고령 환자를 대형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인근 병원 6곳에서 모두 거절당해 결국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요양병원 간호과장은 “상주 전문의가 부족해 고령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결국 대형병원 응급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대형병원도 인력난으로 환자를 거절하면서 환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형병원의 진료 여력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내과계 중환자실 가동률은 2023년에 비해 27% 이상 줄었고, 응급중환자실 가동률도 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응급환자 사망률은 10.5% 증가했다. 서울대병원 하은진 교수는 “인력과 병상이 충분했더라면 더 많은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증환자 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의료공백에 따른 초과사망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촘촘한 진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도 “수가 인상이나 경증환자 제한 같은 땜질식 대책이 아닌, 응급실 배후진료 강화 등 구조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갈등을 장기화하지 말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한해서라도 실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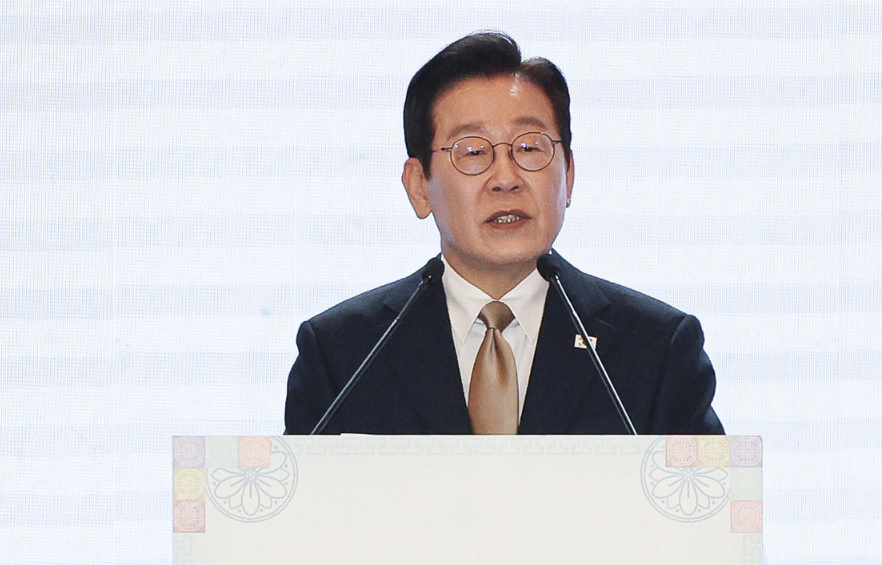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