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가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움직임은 또다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원 결정의 잠정 유예를 요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서자, 2년 전 의료 파동의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대 정원 논의가 충분한 검증 없이 속도에 치우쳤다는 의료계의 지적은 이해할 여지가 있다. 다만 수험생과 학교 현장이 이미 일정에 맞춰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개학 시점까지 결정을 미루라는 요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미 시행까지 됐던 정책을 새 사안처럼 문제 삼는 태도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37년까지의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4262~4800명으로 제시하며 논의 범위를 좁혔다.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를 제외하면, 2027~2031년 증원 기간을 감안할 때 연간 700~800명 수준이 거론된다. 2024년 의료 대란 당시와 비교하면 증원 폭은 크게 줄었다. 그럼에도 의료계의 반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다수 국민이 공감한다. 병원 전전 끝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반대만 외치고 대안은 제시하지 않는 집단행동이 반복된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의료 인력 계획은 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돼야 하지만, 코로나 대응에 집중되며 중장기 계획이 미흡했던 점은 정부의 책임이다. 정권 교체에 따라 의사 부족 추계가 크게 달라진 것도 정책 신뢰를 떨어뜨렸다. 한쪽에서는 2035년까지 1만5000명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다른 쪽에서는 그 3분의 1 수준을 논의하는 혼선이 이어졌다. 의료 정책이 정치 일정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고령화로 노인 의료 수요는 늘고, 저출산으로 일부 필수 진료과 수요는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도 감안해야 한다. AI 기술 발전, 실손보험에 따른 과잉 진료,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수도권 쏠림 등 변수도 많다. 그렇기에 더욱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한 논의가 필요하다.
의대 증원이 곧 의사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과거 더 많은 정원 속에서도 우수한 의사들이 배출됐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집단행동으로 압박하기보다 객관적 통계와 현실적인 대안을 놓고 정책 경쟁을 벌이는 것이 전문가 집단의 책임이다.
집단행동의 피해는 정부가 아니라 환자에게 돌아간다. 지역 병원의 전임의 충원율이 급락하고,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현실이 이를 보여준다. 정부 역시 의료계를 힘으로 누르려 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양측이 건설적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야 한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정책을 더 이상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데이터와 대안으로 승부할 때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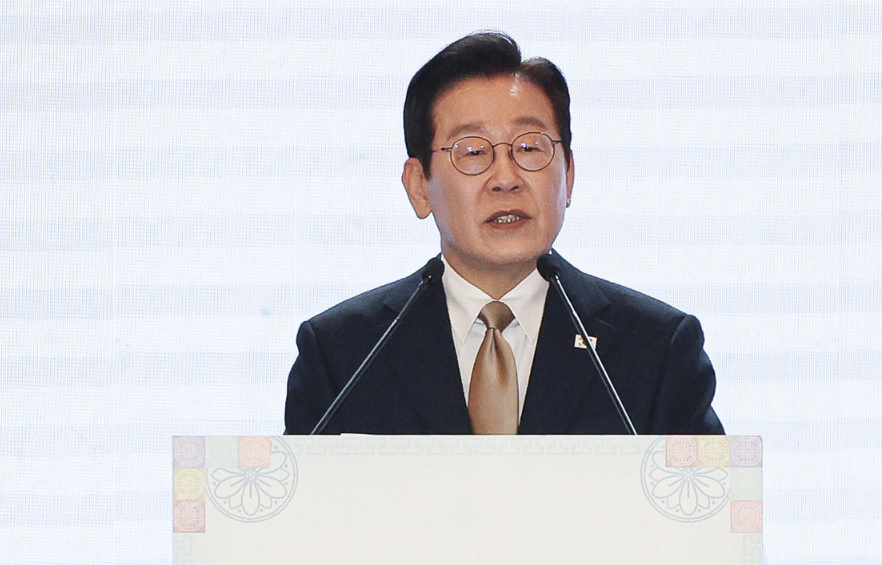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