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초고층 빌딩 건설과 문화유산 보존을 내세운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랜드마크 조성을 주장하며 고층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고, 국가유산청과 야당은 세계유산 종묘 인근에 초고층 건축물이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논쟁의 초점은 정작 현지 거주민과 상인들의 삶을 개선할 방안에서 벗어나 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개발 붐을 띄우려는 시정과 문화 보존 명분을 내세워 이를 견제하는 정치권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풍수지리까지 동원된 과장된 발언이 이어지는 사이, 세운4구역 주민과 상가는 장기간의 불확실성, 영업 손실, 이주 압박 등 현실적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안정화, 생활 기반 유지 등 시민을 위한 실질적 대안은 논의에서 배제된 상태다. 개발 이익 환수 계획도 불투명해 공적 활용 가능성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광객 유치 논리를 앞세운 개발주의와 보존주의가 맞붙고 있으나, 두 주장 모두 시민 생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뉴욕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대규모 ‘임대료 안정화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흐름과 대조적으로, 서울 도심 핵심 공간을 둘러싼 논쟁은 주민을 방치한 채 정치적 계산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세운4구역이 누구를 위한 개발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뒤늦게 제기되고 있으며, 논쟁은 이제 시작 단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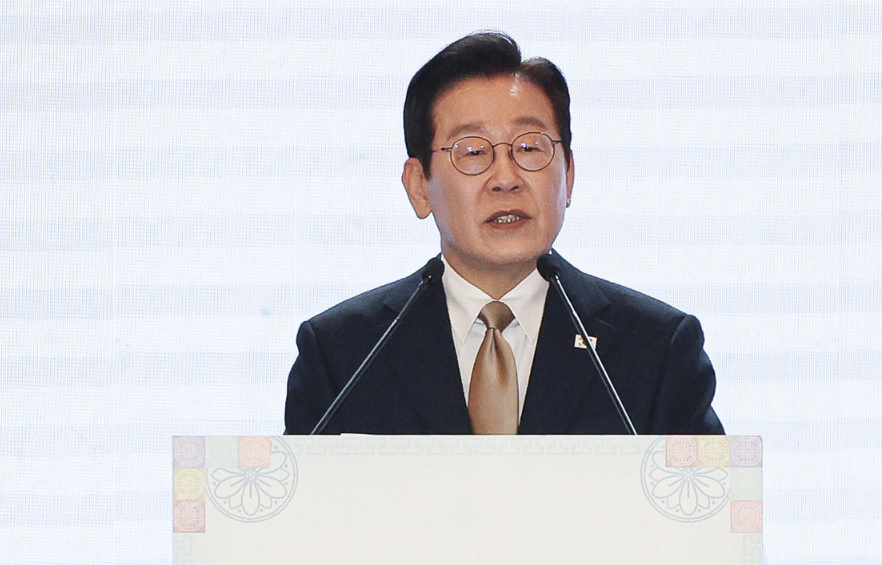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