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언제나 조용히 경고한다. 다만 인간이 그 신호를 외면할 뿐이다. 최근 국제 금값과 은값의 급등은 단순한 투자 붐이 아니다. 세계 질서가 흔들릴 때마다 반복돼온 실물자산 회귀의 전형적인 장면이다. 전쟁과 지정학적 충돌, 통화 팽창, 가상자산의 범람 속에서 시장은 다시 가장 오래된 자산을 찾고 있다.
현재 한국의 금 보유량은 약 104톤 수준이다. 세계 순위로는 40위 안팎이다. 경제 규모와 무역 규모를 고려하면 결코 많은 양이 아니다. 더 아쉬운 대목은 한국은행이 2013년 이후 사실상 금을 추가 매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사이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미·중 전략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까지 겪었다. 중앙은행들이 다시 금을 사들이는 흐름이 분명했음에도 우리는 관망을 택했다.
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금은 화폐의 마지막 신뢰다. 달러가 흔들릴 때, 국채가 정치에 포획될 때, 사람들은 금을 찾는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은 금을 수익 자산이 아니라 안보 자산으로 보유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는 물론 신흥국들까지 금 보유를 늘려왔다. 특히 제재와 금융 봉쇄를 경험한 국가일수록 금의 의미는 더 커졌다.
은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은은 금과 달리 산업 수요가 강한 금속이다. 반도체,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까지 은은 첨단 산업의 혈관 역할을 한다. 동시에 화폐 역사에서도 은은 금과 함께 신뢰의 축을 담당해 왔다. 최근 은 가격의 급등은 단순한 투기라기보다 탈달러·탈종이화폐 흐름과 실물 산업 수요가 겹친 결과로 해석된다.
문제는 한국의 전략 부재다. 외환보유액을 주로 달러 자산에 의존해 온 선택은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보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국부란 단기 수익이 아니라 위기 대응력이다. 만약 지난 10여 년간 점진적으로 금과 은을 매입했다면, 지금 우리는 상당한 평가이익과 함께 금융 안전판을 동시에 확보했을 것이다. 이는 투자 실패가 아니라 통찰의 부재다.
통화량은 팽창했고, 가상자산은 늘어났으며, 세계는 다시 블록화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실물자산의 가치는 구조적으로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 금과 은의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신뢰의 이동을 보여주는 신호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시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시장보다 한 걸음 앞을 보는 데 있다. 국부 창출은 공장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통화 정책과 자산 배분에서도 만들어진다. 금을 사지 않은 과거의 선택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선택은 여전히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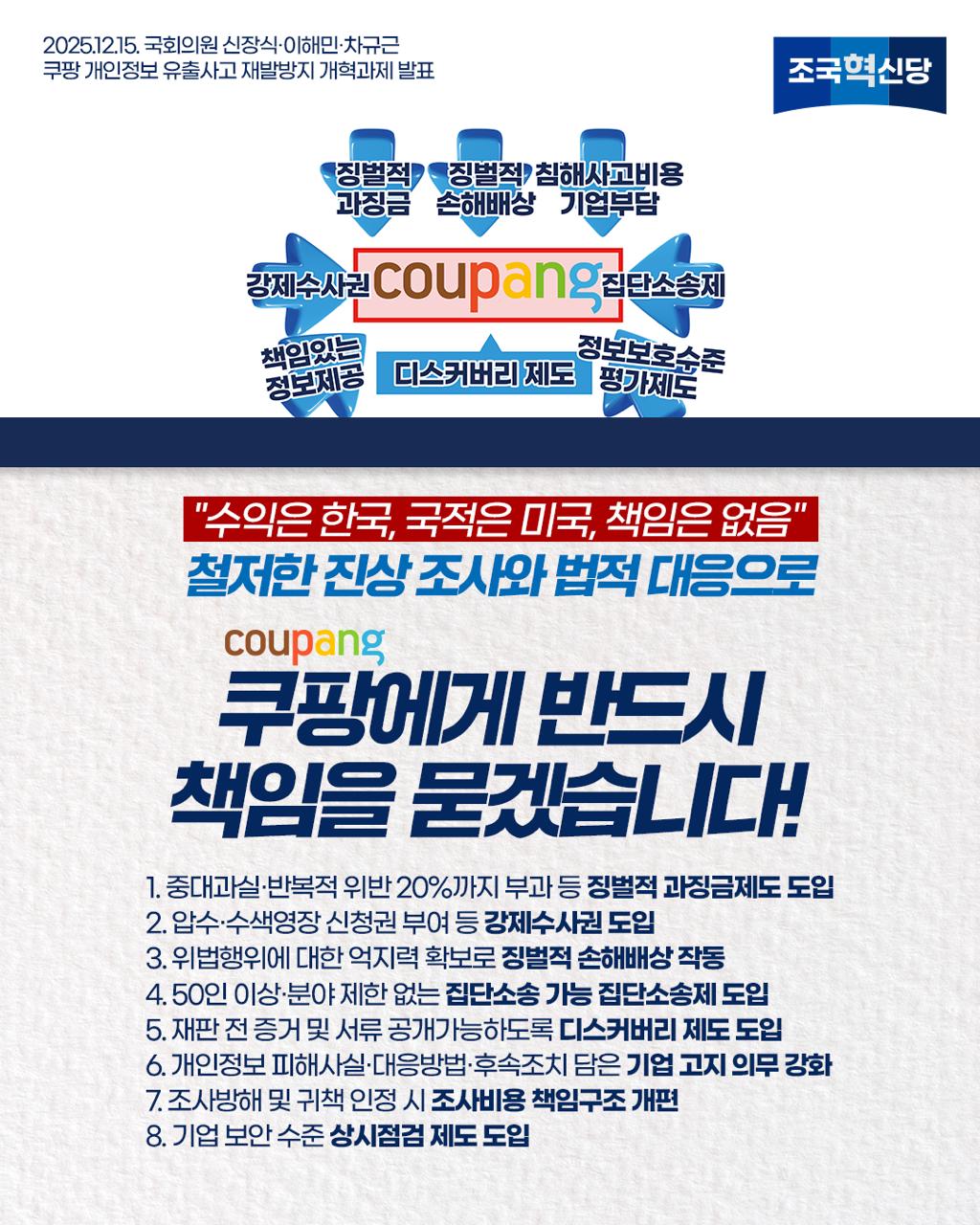






댓글 남기기